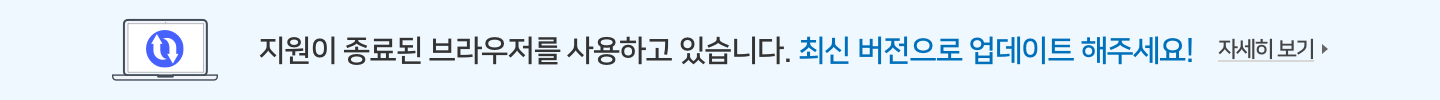이웃집 인심, 너무 많이 변했다 2016.10.27
필자 나이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니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을 돌아본다면 아무리 강퍅한 도심이라 하더라도 그 시절의 이웃은 말 그대로 이웃사촌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창문을 열면 이웃집 마당이고 때로는 창문과 창문이 좁은 골목을 사이로 마주보고 있어서 서로 아이 이름을 부르면 바로 창문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저녁 찬거리 양념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던 것 같다.
지금은 재개발이 돼 거의 없어졌지만 소위 ‘달동네’라고 부르던 곳에서는 두 개의 집이 하나의 벽을 사이에 두고 지어져서 겨울에 옆집이 비면 우리 집이 추위와 싸워야 했던 기억도 있다.
이렇게 지내는 정도가 되면 집집마다 담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마당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 기억이 그리 오래 전의 일도 아닌 듯한데 지난주 도심의 아주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옆집의 마당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려다가 옆집 주인의 반응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리모델링을 하려는 집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고, 옆집은 10년 전쯤에 새로 재건축을 해 4층 다가구주택으로 지어져 있었다.
한데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집의 화장실 담이 옆집의 경계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연하게 경계를 침범한 집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집을 이렇게 지어서 살아온 지가 40년이 넘은 상태여서 예전의 잘못된 경계 측량을 원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집이 지어진 지 40년이 넘다 보니 블록과 시멘트로 발라 지어진 담이 오랜 세월에 풍화돼 들뜨고 부서져 내려 벽이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이 벽을 시멘트로 땜질을 하고 공사를 하는 김에 외벽에 단열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50㎜ 두께의 단열재를 붙이려 하자 그만큼 옆집의 땅을 또다시 침범하게 되므로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단열재 한 겹을 더 붙여주지 못하고 시멘트만 덧바르고 마감을 하면서 이웃집 인심이 이렇게까지 변했나 싶어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자료 제공 :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