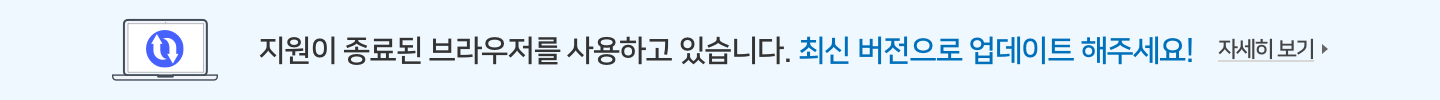퇴직연금, 개인이 운용하는 DC·IRP 시대 활짝⑴ 2016.11.29

이전까지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대부분 회사가 운용·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퇴직급여의 운용 주체가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정부의 IRP(이하 개인형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강화 등으로 투자 유연성과 세제 혜택이 높은 DC형(이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처음제도 도입을 논의하던 때만 해도 DB형(이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어떤 방식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도입해 회사와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퇴직연금 도입 초기만 해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기업이 많았다.
무엇보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금 계산 방식이 동일한데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다소 낯설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를 운용할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근로자가 져야 한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남들보다 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많았다.
퇴직급여 운용 주체, 회사에서 개인으로 이동
그런데 최근 퇴직연금 운용 주체가 회사에서 근로자와 퇴직자 등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 비중을 살펴보자.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2012년 63.3%에서 2015년 58.2%로 감소했다.
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비중은 같은 기간 34.7%에서 40.4%로 크게 늘어났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 비중을 보면 이 같은 변화는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같은 기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 49.7%에서 29.4%로 크게 감소한 것과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33.4%에서 57.4%로 급증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과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적립금 규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7.8%에서 2013년에는 20.1%, 2014년에는 21.7%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22.5%까지 늘어났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이 126조4000억 원인데, 이 중 28조4237억 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IRP 적립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한도 300만 원은 퇴직연금에 적립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세제 혜택 확대로 지난해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적립한 돈이 6556억원이나 늘었다.
직전 연도(813억 원)와 비교해 적립금이 8배 가량이나 늘어난 셈이다.
Tip.
①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제도다.
②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③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급여를 이체하거나 추가 적립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다.
자료제공: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와 투자49호>
정리: 한승영 기자 ashs@mediawill.com